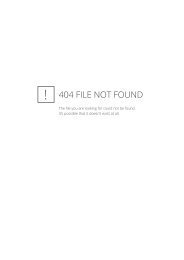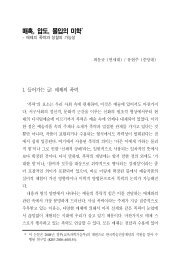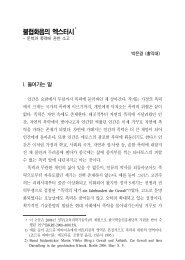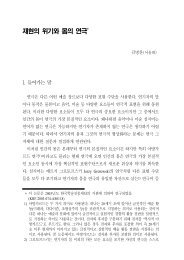Down - 한국뷔히너학회
Down - 한국뷔히너학회
Down - 한국뷔히너학회
Create successful ePaper yourself
Turn your PDF publications into a flip-book with our unique Google optimized e-Paper software.
페터 바이스와 언어의 가능성․이순예 47<br />
이러한 경지에 이르게 하는 호머의 예술적 기교는 “하나의 사물에 Für ein<br />
Ding 하나의 특성 nur einen Zug” 17)만을 부여하는 데 있다. 바로 ‘전체의 줄거리<br />
에서 차지하는 그 부분의 몫’만을 선택하여 호머는 사물들을 줄거리로 이어지도<br />
록 배열한다는 것이다. 이는 직선적인 발전 Lineare Entwicklung의 질서를 추구하<br />
는 것으로서 버질의 작품에서 보이는 공간적 확산 Räumliche Entfaltung에 따르<br />
는 사물의 질서와는 근본적으로 차별된다. 레싱은 버질의 묘사에서 아래의 부분<br />
을 직접 인용하면서 사물의 병존 Koexistieren을 드러내는 일이 언어의 질서에<br />
부합하지 않음을 역설한다.<br />
그들은 거대한 방패를 연마한다. […] 저쪽에서는 부풀어 오르는 거푸집에 계속 공<br />
기를 뿜어 넣었다가 또 빼냈다가 한다.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쉭쉭거리는 물덩이를<br />
물 속에 집어넣는다. […] 다부진 팔을 들어올려 단단한 부삽을 집어 어마어마한 덩<br />
어리를 이리저리 돌린다. 18)<br />
‘계몽된’ 인간이라면 즉 변화를 따라잡아 파악하는 가운데 자신의 실존을 확<br />
보하겠다는 의지를 지닌 근대인이라면 이 장면을 지루하다고 느낀다. 그 까닭은<br />
공간적 확산을 언어로 기록하여 독자의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주겠다는 이른바<br />
묘사의 의도가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. 물체를 부분으로 나누어 묘사하는 것<br />
을 문학적 수단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이유를 레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.<br />
물체의 병렬 Koexistieren des Körpers이 언설의 연속 Konsekutiv der Rede과 충돌하기<br />
때문에, 그리고 또 병렬을 연속으로 해체하면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는 일이 좀 더<br />
쉬워질 수는 있겠지만, 그 부분들을 다시 연결하여 최종적으로 전체를 다시 복원해<br />
내는 일은 무척 어렵고,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. 19)<br />
문학이 인위적인 부호인 활자로 어떤 사물을 공간적으로 ‘그린’다면, 부호와<br />
지시대상 사이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. 이는 공간적인 인지를 시간 속<br />
16) Ebd., S. 106~107.<br />
17) Ebd., S. 92.<br />
18) Ebd., S. 108에서 재인용.<br />
19) Ebd., S. 100.<br />
48 뷔히너와 현대문학 26<br />
에서 발현되면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언어로 전환시킬 때 속도상의 지체가<br />
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. 시간적인 연속은 ‘보는’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<br />
다. 이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인지능력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. 시간적인 인지<br />
속도와 공간적인 인지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형상적인 묘사를 하면서 물<br />
체를 일단 부분들로 나눈 후에 이 부분들을 다시 전체로 조합해내는 일이 그토<br />
록 어려워지는 것이다. 여기에서 우리는 레싱이 언어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시<br />
간성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. 그리고 그가 계몽주의자답게 시간<br />
은 ‘진보’ 즉 앞으로 나아가는 사물의 질서를 동반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<br />
있음도 알 수 있다. 이러한 관점에 따라 레싱은 문학이 ‘계몽된’ 사물의 새로운<br />
질서에 걸맞은 ‘전진적인 fortschreitend’ 사유를 제고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<br />
요청하였다. 이에 따라 물체를 ‘완성된’ 상태가 아닌, ‘되어가는 werden’ 과정으<br />
로 보여주어야 함을 문학적 형상화의 원칙으로 내세웠고, 호메로스의 서사시를<br />
통해 예증하였다.<br />
흐르는 시간 속에서의 변화를 ‘순환’으로 인식하지 않고 ‘진보’로 받아들이는<br />
관점이야말로 계몽주의자의 자기의식에서 제1조목에 해당할 것이다. 레싱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