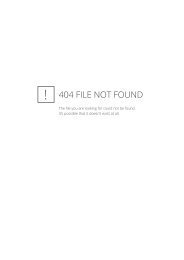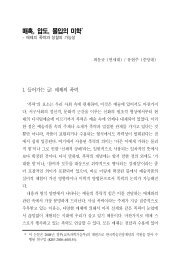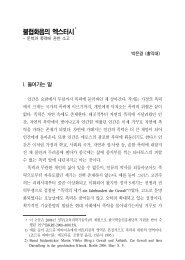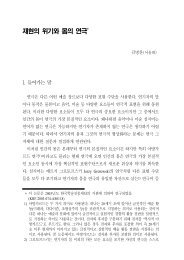Down - 한국뷔히너학회
Down - 한국뷔히너학회
Down - 한국뷔히너학회
You also want an ePaper? Increase the reach of your titles
YUMPU automatically turns print PDFs into web optimized ePapers that Google loves.
페터 바이스와 언어의 가능성<br />
- 언어 Sprache와 형상 Bild, 서술 epische Darstellung과 묘사 sinnliche Beschreibung<br />
의 구분에 대한
페터 바이스와 언어의 가능성․이순예 41<br />
없으며, 이 분리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삶이 더욱 어려워질 것임이 분명하지만,<br />
‘정치와 실존의 의식적인 분리’를 진정 형상화의 원칙으로까지 확대시켜 보아야<br />
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. 바이스의 경우 두 차원이 서로 충돌하고 있<br />
음은 사실이다. 하지만 그렇다고 이 충돌을 예술창작과정에 나타나는 창의적인<br />
무엇으로 절대화해야만 하는가? 그보다는 오히려 예술이기 때문에 현실에서와<br />
는 달리 극복되어야 할 무엇으로 상대화할 필요는 없을까? 실제로 소설
페터 바이스와 언어의 가능성․이순예 43<br />
별도의 ‘객관적인’ 법칙이 들어있기 마련이다. 이렇게 하여 마침내 객관적인 세<br />
계의 발전과정과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은 근본적으로 서로 어긋날 수밖에 없는<br />
상태가 일반화되었다. 서구에서 전 사회적으로 계몽을 시작한 18세기 이래 이<br />
불일치 상태가 인간 삶을 규정하는 기초적인 조건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. 현재<br />
계몽을 토대로 하는 서구화가 전 지구적 발전모델로 관철되고 있는 까닭에 우리<br />
는 인간의 ‘자기소외’라는 개념으로 이 문제를 보편화시키기도 한다. 18세기 계<br />
몽주의자들이 발의하고 이후 사회적으로 실천되어 온 서구사회 구성원리를 ‘근<br />
대성 Die Moderne’ 개념으로 정리한 하버마스의 논의에 따르면 근대적인 예술은<br />
두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. 우선 예술을 실체적 이성이 분화<br />
된 영역 중 하나로 설정함에 따라, 예술이 진리추구 과정에 동참해야 한다는 요<br />
구가 제기되었음을 들 수 있다. 이는 ‘장식성’ 혹은 ‘자연스러운 생활감정의 표<br />
출’로 표상되는 예술에 대한 이해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견해가 아닐 수 없다. 하<br />
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‘예술의 이성’은 ‘과학의 이성’이나 ‘도덕’과는 다른 원칙<br />
에 따라 자신을 실현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된다. 실체적 이성이 자신을 확대<br />
발전시키기 위해 “형식적으로만 서로 연관될 뿐인” 8) 세 영역으로 나누어진 까<br />
닭이다. 여기에서 ‘분화’란 같은 뿌리에서 서로 다른 열매가 나왔다는 의미로 해<br />
석될 수 있다. 그리고 이 ‘다름’을 통해서 각 영역은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할 수<br />
있다. 예술은 논증적이지 않으며, 규범적이지도 않고, 다만 예술에 독자적인 미<br />
적 물음에 충실하여 이성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은 것이다. 이 두 번째<br />
과제를 우리는 예술의 자율성 요구로 받아들인다. 자율성과 진리추구는 이처럼<br />
같은 뿌리를 갖는 것이다.<br />
근대예술은 계몽의 결과로 나타나는 진보를 토대로 삼는다는 점에서 신분제<br />
사회의 바로크 예술과 근본적으로 차별된다. 사회적으로 합의된 질서, 비록 정<br />
당하지는 않더라도 모두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질서가 상존한다고 여<br />
겨지는 시기, 사물과 언어의 관계는 단선적일 수 있었다. 이 시기의 문학은 지시<br />
대상과 표현수단인 언어와의 관계에 대하여 현대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였<br />
다. 바로크 시학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‘시는 회화를 닮아간다 Ut Pictura<br />
8) J. Habermas, ebd., S. 41.<br />
44 뷔히너와 현대문학 26<br />
Poesis’는 프로그램에는 언어가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매체일 수 있다는 인식<br />
이 담겨 있지 않다. 하지만 사회질서가 재편되는 변혁기이거나 아니면 개인의<br />
자발적인 판단과 다원성을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각자가 나름대로 대상과의 관<br />
계를 꾸려가야 한다는 요구가 절실해지고, 그러면 언어 역시 정태적인 상태에<br />
머물 수 없게 된다. 계몽주의자들은 진보하는 세계상태에서 사물의 질서를 언어<br />
의 질서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. 그리고 언어예술인 문학은 언어의 질서<br />
로 변환된 사물의 질서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존재하는 자연사물의 질서와는 달<br />
리 미의식이라는 인간이성의 또 다른 존재방식(칸트의 정식에 따르면 판단력<br />
Urteilskraft)에 부응하는 ‘주관적’인 질서를 구축한다고 생각했다. 9) 따라서 이렇<br />
듯 문학언어를 통해 구성된 사물의 미적질서는 변화하는 (진보하는) 세계상태<br />
속에서 살아가는 인식주체에게 변화에 부응하는 의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<br />
고 믿었다. 이른바 문학예술에서의 ‘진보적인 관점’은 인간의 의식이 사물의 변<br />
화를 ‘올바르게’ 포착할 가능성이 되고, 이 올바른 관점으로 세상에 올바른 질서<br />
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. 레싱은 이러한 믿음을 문학의 강령으로 실천한 계몽<br />
주의 작가이다.<br />
레싱은
페터 바이스와 언어의 가능성․이순예 45<br />
의 핵심에 해당한다. 레싱은 그림이 해야 할 본연의 과제와 글이 가장 잘 할 수<br />
있는 일을 드러내주는 상징적인 경우로 과 호메로스 Homer의 서<br />
사시를 들었다. 버질 Virgil의
페터 바이스와 언어의 가능성․이순예 47<br />
이러한 경지에 이르게 하는 호머의 예술적 기교는 “하나의 사물에 Für ein<br />
Ding 하나의 특성 nur einen Zug” 17)만을 부여하는 데 있다. 바로 ‘전체의 줄거리<br />
에서 차지하는 그 부분의 몫’만을 선택하여 호머는 사물들을 줄거리로 이어지도<br />
록 배열한다는 것이다. 이는 직선적인 발전 Lineare Entwicklung의 질서를 추구하<br />
는 것으로서 버질의 작품에서 보이는 공간적 확산 Räumliche Entfaltung에 따르<br />
는 사물의 질서와는 근본적으로 차별된다. 레싱은 버질의 묘사에서 아래의 부분<br />
을 직접 인용하면서 사물의 병존 Koexistieren을 드러내는 일이 언어의 질서에<br />
부합하지 않음을 역설한다.<br />
그들은 거대한 방패를 연마한다. […] 저쪽에서는 부풀어 오르는 거푸집에 계속 공<br />
기를 뿜어 넣었다가 또 빼냈다가 한다.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쉭쉭거리는 물덩이를<br />
물 속에 집어넣는다. […] 다부진 팔을 들어올려 단단한 부삽을 집어 어마어마한 덩<br />
어리를 이리저리 돌린다. 18)<br />
‘계몽된’ 인간이라면 즉 변화를 따라잡아 파악하는 가운데 자신의 실존을 확<br />
보하겠다는 의지를 지닌 근대인이라면 이 장면을 지루하다고 느낀다. 그 까닭은<br />
공간적 확산을 언어로 기록하여 독자의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주겠다는 이른바<br />
묘사의 의도가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. 물체를 부분으로 나누어 묘사하는 것<br />
을 문학적 수단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이유를 레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.<br />
물체의 병렬 Koexistieren des Körpers이 언설의 연속 Konsekutiv der Rede과 충돌하기<br />
때문에, 그리고 또 병렬을 연속으로 해체하면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는 일이 좀 더<br />
쉬워질 수는 있겠지만, 그 부분들을 다시 연결하여 최종적으로 전체를 다시 복원해<br />
내는 일은 무척 어렵고,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. 19)<br />
문학이 인위적인 부호인 활자로 어떤 사물을 공간적으로 ‘그린’다면, 부호와<br />
지시대상 사이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. 이는 공간적인 인지를 시간 속<br />
16) Ebd., S. 106~107.<br />
17) Ebd., S. 92.<br />
18) Ebd., S. 108에서 재인용.<br />
19) Ebd., S. 100.<br />
48 뷔히너와 현대문학 26<br />
에서 발현되면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언어로 전환시킬 때 속도상의 지체가<br />
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. 시간적인 연속은 ‘보는’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<br />
다. 이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인지능력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. 시간적인 인지<br />
속도와 공간적인 인지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형상적인 묘사를 하면서 물<br />
체를 일단 부분들로 나눈 후에 이 부분들을 다시 전체로 조합해내는 일이 그토<br />
록 어려워지는 것이다. 여기에서 우리는 레싱이 언어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시<br />
간성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. 그리고 그가 계몽주의자답게 시간<br />
은 ‘진보’ 즉 앞으로 나아가는 사물의 질서를 동반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<br />
있음도 알 수 있다. 이러한 관점에 따라 레싱은 문학이 ‘계몽된’ 사물의 새로운<br />
질서에 걸맞은 ‘전진적인 fortschreitend’ 사유를 제고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<br />
요청하였다. 이에 따라 물체를 ‘완성된’ 상태가 아닌, ‘되어가는 werden’ 과정으<br />
로 보여주어야 함을 문학적 형상화의 원칙으로 내세웠고, 호메로스의 서사시를<br />
통해 예증하였다.<br />
흐르는 시간 속에서의 변화를 ‘순환’으로 인식하지 않고 ‘진보’로 받아들이는<br />
관점이야말로 계몽주의자의 자기의식에서 제1조목에 해당할 것이다. 레싱이
페터 바이스와 언어의 가능성․이순예 49<br />
로’ ‘미성년상태로부터 벗어나는 일’이라고 정의함으로써, 계몽이란 항상 계몽<br />
이전의 상태를 전제함으로써 수행되는 ‘과정’임을 명백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.<br />
따라서 계몽하는 ‘서술’은 머물러 있는 ‘묘사’를 타자로 전제하면서 늘 의식해왔<br />
다는 이야기도 된다. 묘사와 서술에 대한 논쟁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할<br />
필요성이 발생하면, 늘 새롭게 제기되곤 했다. 그런데 드디어 20세기 말에 이르<br />
러 “서술하지 말고 묘사하라” 22)는 외침이 나온 것은 언어의 속성들에 대한 평가<br />
가 바뀌게 되었음을 드러냄과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진보에 대한 피로감이 표면<br />
에 부상한 결과로 보인다. 바이스의 연설문을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수용한다.<br />
2. 근대적 언어의 한계<br />
레싱의
페터 바이스와 언어의 가능성․이순예 51<br />
세기의 바이스는 기존의 질서를 고정시키는 언어를 뚫고 나올 형상의 힘에 의지<br />
하여 현존하는 질서의 전복을 꾀할 수 있다고 믿었다. 형상의 힘을 이처럼 신뢰<br />
하기까지, 언어의 무능력에 대한 자각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은 앞에서 지적한<br />
대로이다. 29) 하지만 남덕현도 지적하였듯이, 바이스가 언어의 해방적 기능에 대<br />
한 믿음을 레싱과 공유하였음은 분명해 보인다. 30) 바이스가 언어의 무능력 앞에<br />
서 절망하였다면, 이는 현재 투입할 수 있는 언어가 해방적 기능을 크게 손상당<br />
한 상태이기 때문이다. 바이스는 사회주의적 전망을 문학작품으로 펼쳐 보이기<br />
위해 ‘형상’의 ‘파괴력’에 주목하였다.<br />
이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동일시는 ‘분석하지 않는’ 바이스의 연설문을 정<br />
치적 텍스트로 읽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. 그런데 전통적으로 정치성을 담보한다<br />
고 여겨지는 기법인 ‘서술’이 아니라 ‘묘사’를 통해 상태를 나열하기 때문에, 바<br />
이스의 텍스트는 지금까지 정치적인 선언문에서 볼 수 있었던 ‘진보’하는 움직<br />
임을 내보이지 않는다. 바이스 문학이 이중성을 띤다는 분석은 대부분 이와 같<br />
은 외견상의 불일치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. 바이스의 문학에서 아방가르드<br />
적 요소를 찾아보는 연구들이 그렇고, 정치성과 실존성을 결합한다는 지적도 있<br />
을 수 있다.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질적인 두 요소의 ‘충돌’을 남덕현의<br />
경우에서처럼 형상화의 원칙으로 절대화시키는 경향을 보인다. 이 대목에서 필<br />
자가 ‘정치성’과 ‘실존성’은 궁극적으로 화해 불가능한 요소들일 수밖에 없는가<br />
하는 의문을 품었음은 이미 앞에서 밝힌 대로이다.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스가<br />
문학작품에서 형상화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였음을 지적하는 정<br />
항균의 논문 31)은 참신한 바가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항균 역시 초현실주의<br />
29) 바이스는 언어가 낡아 버렸음도 지적한다. 폭력과 파괴로 삶이 손상됨에 따라 가치들도 분쇄<br />
되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형식들이 새로 마련되어야만 하게 되었다. 퇴락하는<br />
들에서는 살아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의심쩍어지기 마련이다. Vgl, Peter Weiss, ebd., S. 184.<br />
30) 남덕현, 앞의 책, 280쪽.<br />
31) 정항균은 바이스에게서 나타나는 이중성을 바이스 문학의 미학적인 문제로 해석하는 연구<br />
를 수행하였다. 바이스가 초기 유아주의적 입장에 빠져 있다가, 실존주의적 경향과 사회비<br />
판적 경향이 공존하던 단계를 지나 마르크스주의 작가로 입지를 굳혔다는 ‘일반적인’ 평가<br />
가 “작가로서의 바이스의 발전에 나타나는 연속적인 측면을 간과할 위험”이 있다는 지적<br />
과 더불어 정항균은 “바이스의 작가적 발전에 나타나는 연속성”에 주목한 것이다. 바이스<br />
에 대한 기존의 연구논문들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정항균은 바이스에게서 볼 수 있<br />
는 두 가지 ‘이질적인’ 요소들이 전기적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. “마르크스주<br />
52 뷔히너와 현대문학 26<br />
적 요소는 ‘개인적 자유’에, 기록극적 요소는 ‘사회주의적 전망’에 귀속시키는<br />
논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.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바이스의 초기작품<br />
에 관심이 기울여지는 까닭이 초기작품들에서도 높은 정치의식과 사회에 대한<br />
관심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옳다. 하지만 그 이유가 이미 초기에<br />
도 ‘기록문학적 요소’가 나타나고, 후기에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한 후에도 ‘초현<br />
실주의적 요소’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머물러 미흡함을 남겼다. 32) 그보<br />
다는 오히려 바이스가 이른바 ‘사회비판적’ 요소와 ‘실존적인 요소’를 결합하려<br />
노력하였고, 바로 이 결합에 바이스의 독창성이 있음을 규명하는 작업이 더 생<br />
산적일 수 있다. 바이스의 연설문에서 보듯, 바이스는 이질적인 두 요인을 하나<br />
로 연결하고 있다. 그리고 그 연결고리 중의 하나로 ‘사회적 약자’에 대한 관심<br />
을 ‘묘사’라는 문학적 구성의 원칙에 따라 실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.<br />
정치적 관심을 일반적인 관습과는 달리 ‘묘사’에 의지하여 표현하는 바이스는<br />
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. 그리고 이를 연설문에서<br />
제시하였다. 바이스로서는 우선 현실의 경계들을 넘어서는 ‘전복력’이 필요했고,<br />
또 새로운 전망을 열기 위해 현실의 억압구조를 ‘인식’하는 일도 필요했다. 바이<br />
스는 현재의 언어가 전복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보았다. 따라서 형상의<br />
강렬함을 언어화하는 묘사를 차용하였다. 하지만 전복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<br />
는 것이 아니라 ‘새로운 질서’를 위한 것이어야 했다. 바이스를 아방가르드주의<br />
자로 분류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적 전망을 확신하는 정치적 작가로 분<br />
류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. 바이스의 정치적 지향은 언어의 질서능력을<br />
필요로 하는 것이었다. 결국 형상과 언어는 바이스에게서 모두 불가결한 요소가<br />
의 작가로 전향한 후”에도 여전히 초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“개인의 자유와 해방에<br />
대한 관심과 초현실주의적 요소”가 엿보임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는 예술적 형상화의 측면<br />
에서 다루어야 함을 논증하였다. 정항균: 「 페터 바이스의 작품에 나타난 기록문학적 요소<br />
와 초현실주의적 요소의 기능에 관하여」 ,
페터 바이스와 언어의 가능성․이순예 53<br />
된다.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바이스의 독창성은 ‘실존적 강렬함’과 ‘질서’를 유기<br />
적으로 결합한다는 데 있다. 바이스의 연설문은 이 두 ‘이질적인’ 필수요소들이<br />
결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. 서로 상대화됨으로써 꼭 필요하지만 성질상 서로 다<br />
른 두 요인이 결합되는 것이다<br />
형상은 말들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. 그가 형상의 개별적인 것들에 대해 생각할 때,<br />
그것들은 이미 효력을 잃게 된다. 그는 무조건 어떤 형상의 가치를 믿어야만 한다.<br />
그가 형상에 사로잡혀 있을수록 그는 형상의 동기들에 대하여 개의치 않게 되며, 그<br />
런 만큼 전달된 효과는 더욱 더 믿을 만한 것이 된다. 말들은 언제나 질문들을 담고<br />
있다. 말들은 형상들을 의심한다. 말들은 형상들의 구성요소들을 싸고돌며 그것들을<br />
분해한다. 형상들은 고통에 만족한다. 말들은 고통의 시원을 알고자 한다. 33)<br />
‘고통’에 머무는 일과 그 ‘고통’의 시원을 알고자 하는 일은 모두 이를 극복하<br />
기 위함이다. 이러한 정치적 전망을 위해 무엇보다도 고통을 작품에 담아야 하<br />
고, 또 그 내용이 우리 체험의 시원성에 가 닿는 것일 필요가 있다. 여기에서 우<br />
리는 남덕현이 바이스에게 주문한 바 있는 “형상에 대한 시기심” 34)을 토대로 한<br />
구성의 필요성을 바이스 스스로 언어의 한계를 확인하는 가운데 이미 받아들이<br />
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“형상은 말들보다 더 깊은 곳”에 있는 까닭에 체험의 강<br />
렬함을 드러낼 수 있다. 그러면 이는 전복력으로 전환될 것이다. 하지만 바로 뒤<br />
이어 형상의 한계도 명백히 한다. 형상은 그 “깊은 곳”에 머무는 한에서만 “전달<br />
된 효과는 더 믿을 만한 것”으로 되기 때문이다. 형상이 인식의 대상으로 되는<br />
경우, 형상은 힘을 잃는다. 말들이 그것을 분해하여 버리기 때문이다. 이처럼 언<br />
어와 형상은 나름의 한계 속에서 서로 상대방을 상대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.<br />
그러면 이런 한계들을 명백히 인식한 바이스는 자신의 창작의도를 실현하기 위<br />
해 어떤 입장을 견지했는가? 바이스는 ‘상호보완’이 아닌, ‘한계의 확인과 수용’<br />
으로 자신의 문학적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해 나갔다. 바로 여기에 바이스 문학<br />
의 독창성이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.<br />
전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, 바이스에게는 형상의 한계가 우선 먼저 인식되<br />
33) Peter Weiss, ebd., S. 182.<br />
34) 남덕현, 앞의 책, 280~281쪽.<br />
54 뷔히너와 현대문학 26<br />
었다고 여겨진다. 바이스는 젊은 시절 한때 회화작품은 물론 영화에도 몰두하였<br />
지만, 이들 매체의 선택이 잘못 Irrwege이었음을 명백히 밝히면서 60년대 중반<br />
이후로는 문학창작에 전념하게 된다.<br />
나에게 명백한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. 진리의 가능성(추정: 바이스)은 회의와 모<br />
순들에서 나온다. 내가 이러한 가설적 진리관에 도달하기까지, 참으로 오랜 시간이<br />
걸렸다.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. 나는 바로 이런 (가설적: 필자) 진리를 고정하기 위<br />
해 쓰는 것이라고. 이 말을 하는 나는 착오와 실패의 무수한 경험을 해왔다. 35)<br />
연설문 「 라오콘」 은 바이스가 이러한 심경의 변화를 굳히는 시기에 나온 텍스<br />
트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. 이처럼 형상의 한계를 인식하고 언어로 돌아서면<br />
서도 바이스는 언어의 한계를 명백히 설정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.<br />
그곳에서 (한계지점: 필자) 발생한 문학은 의식의 한계를 넘어서 더 멀리 내다볼 수<br />
있다는 요구를 제기한다. 하지만 실제로는 한계들 앞에도 가보지 못하고 한참 못 미<br />
쳐 멈출 뿐이다. 문학은 모호한 말들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요술이나 피우고 있다.<br />
문학은 너무 지쳐있는 까닭에 절대적 한계지점까지 뻗어있는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<br />
불편을 감수하지 않는다. 36)<br />
문학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한 작가의 언어관치고는 지나치게 상대적인 감이<br />
없지 않다. 하지만 바로 이 상대성을 바이스는 창작기법의 원칙으로 들어올린다.<br />
언어의 상대성을 조형예술적인 요소를 언어화하는 가운데 거듭 재확인하는 것<br />
이다. 이처럼 언어를 상대화함으로써 바이스는 형상의 강렬함이 작품의 표면에<br />
드러나도록 도모할 수 있었다. 하지만 문학작품은 근본적으로 언어예술인 까닭<br />
에 그 강렬한 효과를 ‘정리’하는 작업이 항상 뒤따른다. 소설
페터 바이스와 언어의 가능성․이순예 55<br />
능력을 모두 작품에 담으려고 노력했고, 여기에서 독창적인 구성의 원칙이 수립<br />
되었다. 이렇게 하여
페터 바이스와 언어의 가능성․이순예 57<br />
자신에 고유한 언어의 특성에 의지하여 수행할 수 있는 예술적인 ‘힘’을 발휘함<br />
으로써 나타난 결과이다. 그리고 이 힘에 의지하여 당대의 맥락을 뛰어넘는 전<br />
망을 제시한 바이스 문학에 우리는 예술적 생명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.<br />
III. 결론- 언어의 가능성<br />
20세기 후반, 무척이나 단단하게 보였던 근대적인 가치들이 이른바 ‘포스트’<br />
모더니즘의 강풍을 맞아 토대를 상실하고, 그 결과 서구에서 문화적 지형이 재<br />
편되는 변화가 일어났다. 우리사회에서도 개발독재 기간 동안 경제를 활성화하<br />
고 사회조직을 근대화하기 위해 ‘구성의 원칙’으로 절대화시켰던 여러 가치들이<br />
차츰 재검토 대상으로 등록되기 시작하였다.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근대적인 구<br />
성의 체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, 포스트모더니즘의 회오리가 일부 수그러<br />
진 지금, 오히려 근대적인 가치들에 대해 새롭게 되돌아볼 필요성을 더욱 절감<br />
하는 처지가 되었다. 그중 예술의 자율성 문제는 이와 같은 ‘재검토’ 대상에서<br />
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다. 서구에서 계몽이 근대의 기획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포<br />
함시켜 발전시켜온 예술은 20세기 후반 이른바 대중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‘대량<br />
소비사회’가 도래하자, 사실상 자신의 본래적인 위상을 관철시키기 어려운 처지<br />
에 놓이게 되었다. 현재 ‘예술’은 본격/통속 혹은 고전/팝 Pop 아니면 진지한 예<br />
술과 가벼운 문화상품 등으로 구별되어 유통되고 있다. 이러한 분리수용 현상은<br />
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예술이 새로운 요구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함과 또 다른 한<br />
편으로는 이른바 대중의 ‘새로운’ 요청 역시 자신을 충분히 관철시킬 만한 힘을<br />
지닌 것은 못된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다. 포스트모더니즘 기획은 세계상태의<br />
변화로 나타난 ‘새로운’ 움직임을 기존의 근대성 기획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 혹<br />
은 탈출의 계기로 삼으려 의도했지만, 실제로는 ‘근대’라는 기획을 상대화하고<br />
근거의 정당성을 묻는 움직임으로 귀결되는 선에서 그치고 만 형편이다. 그리고<br />
또 어떻게 보면 포스트모더니즘이 오히려 근대성 기획에 역동성을 부여한 측면<br />
이 있기도 하다.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20세기 후반 문학에서도 활발하게 일어<br />
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. 그중에서도 현대 독일문학은 이 ‘근대성에 대한 재검토’<br />
58 뷔히너와 현대문학 26<br />
를 어느 예술 영역보다도 급진적으로 추진해온 바 있다. 문학은 자신의 존재근<br />
거를 자명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하였으며, 형식실험을 하면서 심지어 자기<br />
해체의 길로 나아가기도 하였다. 문학은 스스로를 반성하였고, 이 과정에서 무<br />
엇보다도 자신이 언어예술이라는 점에 대한 자각을 더욱 심화시켰다.<br />
필자는 본 논문에서 페터 바이스의 연설문 「 라오콘 혹은 언어의 한계들에 대<br />
하여」 를 이와 같은 ‘패러다임의 변화’라는 관점에서 고찰해보았다. 그리고 바이<br />
스의 경우 ‘근대성에 대한 반성’이라는 시대적 요청이 언어의 근대성에 대한 재<br />
검토로 실현되었음을 확인하였다. 바이스는 20세기 후반, 근대의 문화적 기획에<br />
나타난 지각변동을 문학의 내부로 끌어 들여 반성하였고, 그 결과를 ‘언어의 한<br />
계’로 정식화(연설문)하였을 뿐 아니라, 전혀 새로운 형식의 소설(
페터 바이스와 언어의 가능성․이순예 59<br />
되고 개별적인 구속력도 확보하고 있는 동안, 언어의 서사성은 사물에 내재된<br />
객관적인 법칙을 드러내 개인에게 알려주는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. 그러면 세<br />
계와 개인은 ‘진보’의 법칙에 따라 사물의 질서를 구성해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.<br />
바이스의 언어에 대한 재검토는 이러한 ‘근대적’ 신념에 대한 재검토의 의미를<br />
지닌다. 바이스는 언어의 감성적인 측면을 활성화시키려 노력하였다. 필자는 이<br />
러한 노력이 바이스에게서 ‘객관적인 진보’를 상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<br />
단한다. 그리고 이를 소설
Zusammenfassung<br />
Peter Weiss oder über die Möglichkeiten der Sprache<br />
페터 바이스와 언어의 가능성․이순예 61<br />
Rhi, Shun- Ye (Seoul National Uni)<br />
Die literarische Leistung von Peter Weiss veranlasst, einen neuen Blick in die<br />
herkömmlichen Verhältnisse zwischen Bild und Sprache zu werfen. Traditionell<br />
verstehen sich diese Verhältnisse hauptschlich durch das Verhältnis zwischen Raum<br />
und Zeit. Für diese Entwicklung hat Lessings ästhetische Schrift Laokoon oder über<br />
die Grenzen zwischen Malerei und Poesie Entscheidendes geleistet. Er kämpfte für ein<br />
Gestaltungsprinzip, welches mit der Fortschrittsidee der Aufklärung zurecht kommt.<br />
Die ‘neue’ Literatur soll im Gegensatz zur Literatur des Barock das bildliche<br />
Moment vermeiden, damit eine neue Ordnung der Dinge herbeizufhren ist. Dieses<br />
Gestaltungsprinzip ist als Erzählen zu benennen, indem man die bildliche<br />
Vergegenwärtigung das Beschreiben nennt. Solange sich die Fortschrittsidee allgemein<br />
akzeptierbar vorstellt, wird das Erzählen bevorzugt. Es ist sehr bemerkenswert, dass<br />
Peter Weiss, ein überzeugter Aufklärer, dieses epische Moment der Sprache in<br />
Misskredit bringt. Er redet über die “Grenzen der Sprache”. Jedoch schreibt er mit<br />
dieser unzulänglichen Sprache weiter. Ein neues Gestaltungsprinzip entsteht aus der<br />
Selbstrelativierung der Sprache.<br />
In dieser Arbeit habe ich versucht, Weiss's neues Verständnis über die Sprache mit<br />
dem Paradigmenwechsel im Projekt der Moderne verknüpft darzustellen. Weiss hat<br />
seine neue Einsicht sowohl theoretisch begründet als auch im Roman praktiziert. Sein<br />
sprachliches Experiment hat in der Ästhetik des Widerstandes etwas Ungewöhnliches<br />
zur Folge gebracht: Die bildliche Beschreibung relativiert die epische Entwicklung<br />
des Inhaltes, damit hat der` Roman eine weitere politische Perspektive eröffnet, die<br />
über den Sozialismus hinausgeht.<br />
62 뷔히너와 현대문학 26<br />
주제어: 서술, 묘사, 근대성, 언어의 자기반성<br />
Schlüsselbegriffe: Erzählen, Beschreiben, die Mordene, Selbstreflexion der Sprache<br />
e- mail: minna@snu.ac.kr<br />
투고일: 2006. 03. 31 / 심사일: 2006. 04. 13 / 심사완료일: 2006. 04. 23